
빈곤 경험과 낮은 학력이 청년들의 취업·분가·결혼을 늦추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인으로의 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전용 계좌 정책 등을 제언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 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200여 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각 개인의 생애를 20대, 3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40세의 삶의 질 지표를 산출해 시계열적으로 다루는 '시퀀스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습니다.
39세의 나이에서 빈곤을 겪지 않은 청년이 4가지를 모두 이행한 비율은 48.69%였지만, 빈곤한 청년 중에서는 35.26%만이 4가지 생애사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47.04%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9세에 졸업·취업은 했지만, 분가·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도 빈곤 집단은 16.03%, 비(非)빈곤 집단은 12.33%로 가난한 청년들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특히 졸업 이후 취업·분가·결혼을 모두 하지 못한 경우가 빈곤 집단은 25세 기준 25.64%에 이르렀고 39세에서도 10.90%나 됐지만, 비빈곤 집단은 25세 기준 8.10%에 불과했고 39세 기준으로는 4.00%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빈곤 집단의 경우 고용으로의 이행이 더디며, 고용 상태에 진입하더라도 이후 분가나 결혼으로 이행함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학력도 생애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졸 이하 집단은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같은 나이일지라도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또 이 네 가지 생애사 사건의 이행 시점과 40세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취업이 늦어질수록 우울감은 컸고 자아 존중감은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실업 상태로 인해 삶이 불안정하거나 전업주부 경로로 인한 영향이 혼재돼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혼 시기와 여부도 청년기 이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은 집단은 결혼 경험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결혼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서적 측면과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교육·노동·분가·결혼 등의 생애사 단계별 이행이 정체되면 부정적 효과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점이 이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초기 청년을 위한 조기 개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금융·사회서비스·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년 배낭 계좌'를 설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 소득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실시해 돌봄·기후 대응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시장이 창출할 수 없는 일자리를 정부가 청년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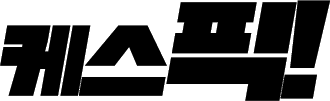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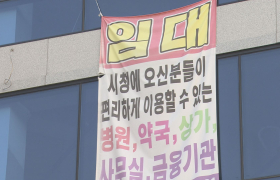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