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 청년 뚤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번번이 그 손을 놓았습니다.
"또 맞으면 그때 오세요."
지난해 10월 20일, 농장의 홍모 사장에게 폭행당해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소를 찾은 프렘이 경찰에게 들은 말입니다.
진술서를 냈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음에 또 맞으면 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프렘은 빈손으로 돌아섰고, 다음 날 농장의 홍 사장은 프렘에게 '스스로 넘어졌다'는 합의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폭행 피해자 파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파온에게 노동부 목포지청 민원실 문은 두껍고 높았습니다.
"(폭행 피해) 한 건으론 접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통역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회사의 엄격한 휴대전화 통제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못했는데, 호소를 들어주는 곳마저 없던 겁니다.
사장의 괴롭힘에 세상을 등진 뚤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뚤시도 고용센터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증거 있냐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못 들어가고,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다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길 수 없었어요. (뚤시 동료 2명의 증언)"
감독 공백도 컸습니다. 전남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48명인데, 감독관 1명이 평균 1,100곳을 담당합니다.
특히 네팔어 통역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고 전화를 걸어도 평균 대기시간은 17분이나 걸려, 노동자들은 호소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화살은 다시 노동자들을 향했습니다.
"일 안 하면 너희들 다 업무방해로 신고한다. 고용노동부, 한국 경찰이 너희 편 들까?"
홍 사장의 훈계와 압박은 또다시 노동자의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뚤시의 죽음이 알려진 뒤에도, 파온은 사업장 변경까지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다시는 인격적 모멸과 괴롭힘을 겪고 싶지 않다"는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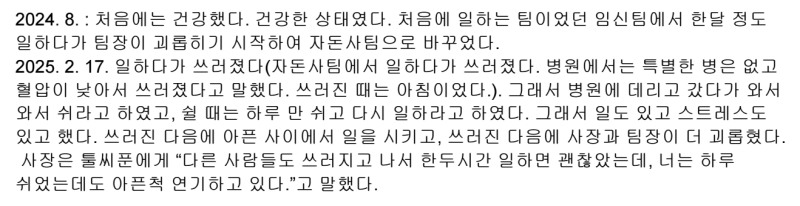
구조적 허점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이주 노동자의 위험 징후를 분석할 자료들은 분절돼 있거나 아예 없고, 신고 접수 절차는 실시간 대응과 거리가 멉니다.
노동청은 사업장 변경을 노린 허위 신고도 많아 모든 민원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이런 고백 뒤에는 "진짜 절규를 가려낼 장치가 없다"는 인정이 숨어 있습니다.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일수록 부당한 노동 행위와 사업주의 괴롭힘을 예방하는 감독은 없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 환경도, 위험한 사업장을 자유롭게 떠나고 옮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도 박탈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는 뚤시가 희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외국인 사업장 감독 강화와 인권 보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뚤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업주의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청한 손을 놓아버린 침묵과 무관심이 더 서늘한 폭력이었습니다.
뚤시의 삶과 죽음이 제도적·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제2·제3의 뚤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온전히 애도 될 수 없는 구조적 폭력에 더 짙게 가려집니다.
후속 기사 <[지옥의 일터③]"돈 보냈으니 끝났다?"..법정서도 발뺌>으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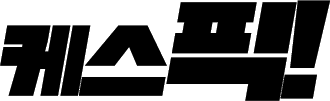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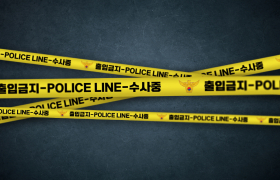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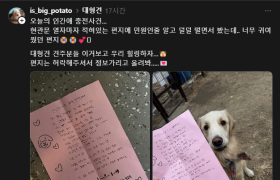






























댓글
(0)